| 브랜드텔링 1+1이란..? 같거나 다르거나, 깊거나 넓거나, 혹은 가볍거나 무겁거나. 하나의 브랜딩 화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해석. |
#기술로_브랜드를_기술하다 1에 이어
[더피알=원충렬]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산다.” 예전 같이 일하던 마케터가 했던 말이다.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 보이는 그가 왜 그런 푸념을 했을까?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겠지.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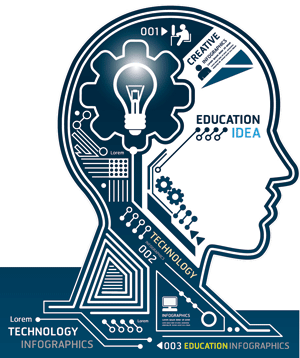
같은 불안을 기업들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던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입을 맞춘 것처럼 기술이라는 화두를 꺼내고 있다. 실용 차원의 기술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다.
근래 다보스포럼에서 기업들이 달려야 할 트랙이 바로 여기라고 가이드를 하고, 연이어 등장한 알파고, 포켓몬고, 아마존고는 닥치고(Go) 냉큼 달리기 시작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시인이자 래퍼인 길 스콧-헤론은 '혁명은 TV로 중계되지 않는다(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고 노래했건만, 어째 지금 TV에는 곧 도래할 것이라는 네 번째 산업혁명 이야기로 온통 가득하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오긴 오려나 보다. 하지만 미래기술의 쇼케이스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런 신박한 기술들은 브랜드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새롭고 신기한 기술이 브랜드의 본질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역으로 다시 강조하자면 브랜드의 본질과 연결되지 않은 기술은 브랜드 그 자체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다. 기술이 브랜드에 기여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경험이 먼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쇼핑몰에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곳이 생겼다. ‘카페X’라는 이 커피숍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태블릿PC나 스마트폰앱으로 주문한 커피를 단 2분 만에 제공한다.
이런 신기술은 어떤 브랜드에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사이렌오더나 AI 기반 챗봇 '마이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테스트하는 스타벅스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고객과의 교감과 공간을 통한 문화를 중요하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고객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경험이다.
그럼 줌피자(Zume Pizza)라면 어떨까? 줌피자는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피자집이다. 사람과 로봇이 협력해 1분에 피자를 48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사람이 도우를 만들면 로봇 '페페와 존'이 소스를 뿌린다. 로봇 ‘마르타’가 도우에 골고루 소스를 펴서 바르면 마지막엔 사람이 토핑을 얹는다. 로봇 ‘브루노’가 이를 받아 오븐에 집어넣으면 초벌구이 완성. ‘빈첸시오’라는 로봇이 초벌구이를 한 피자를 배달트럭에 올리면 마지막 필살기인 ‘배달 중 굽기(bake-on-the way)’가 시작된다.
트럭 뒤에 실린 56개의 이동식 오븐에서 2차로 굽기 시작한 피자는 고객이 문 앞에서 피자를 받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로 배달된다. 배달 과정에서 눅눅해지고 식어버리며 피자 맛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다. 피자 패키지도 그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런 아이디어는 도미노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 기술이 브랜드가 추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은 브랜드 경험을 더 선명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철학이 먼저다
발뮤다 더 고항(BALMUDA The Gohan)은 발뮤다가 새로 출시한 밥솥의 이름이다. 발뮤다는 강력한 팬덤을 자랑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지치지 않고 발뮤다에 대한 애정을 이어갈까? 발뮤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창업자의 이야기가 눈에 띈다. 한때 록스타를 꿈꿨다는 테라오 겐은 약간은 기인 같은 사람이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몇 권의 책과 필기구, 워크맨을 넣은 가방을 메고 지중해 연안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 1년 동안 도보와 버스를 이용한 방랑자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교양서적이나 화장실 벽에 붙인 오늘의 명언 같은 느낌이어서 새삼 감흥이 생길 리 없다. 하지만 발뮤다의 제품과 함께 보면 느낌이 다르다. 기업철학이기도 한 '최소에서 최대를'이라는 모토가 발뮤다의 모든 제품에서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흥미로움과 관심은 한없이 커진다.
발뮤다는 그들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서만 그러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술을 통해 브랜드 철학을 강하게 관철시킨다. 발뮤다가 18개월의 밥솥 연구, 내솥과 외솥의 이중 설계,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고유의 기술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가스 화력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전기 에너지의 적은 화력으로 만들어낼 최상의 밥맛이라고 한다.이는 그들이 앞서 전력소비와 동작음을 최소화하며 강한 소용돌이 바람을 만들고자 한 발뮤다 그린팬이나, 간단한 조작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숨겨 최고의 빵 맛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발뮤다 토스터의 기술과 일맥상통한다. 참으로 일관된다. 브랜드도, 기술도.
브랜드가 하나의 제안이라면, 그 제안을 고객이 선택하고 약속된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기술이어야 한다. 미국의 IT전문지 패스트컴퍼니는 2008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이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 리스트에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회사가 2017년 9위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에서 그리스식 요구르트 선풍을 불러일으킨 초바니(Chobani)가 그 주인공이다. 걸쭉하고 풍부한 맛의 초바니 요구르트는 미국 내 그리스식 요구르트 시장에서만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 의미 있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SNS에 공유되는 사진들을 통해 소비자가 출근 중 차 안에서 식사대용으로 요구르트를 먹고 있다는 것을 보고, 초바니의 용기를 자동차 컵 홀더에 끼우기 쉽게 바꾼 것이다. 기업 마케팅의 대세처럼 여기지는 빅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주인을 만난 셈이다.
공교롭게도 초바니의 이런 시도는, 패스트컴퍼니의 2017년도 혁신적인 기업 1위에 빛나는 아마존의 대표인 제프 베조스가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 오직 고객중심. 제품에서 용기,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과 끝에 자신들이 제안하는 것을 고객이 누리는 과정에서의 문제해결과 만족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브랜드에 있어 기술은 오직 이럴 때 빛난다.
가장 최신이란 가장 마지막이란 뜻과 같다. 브랜딩도 그렇다. 순서가 있다. 기술과 브랜드의 본말이 전도될 수 없다. 브랜드로서 먼저 고객에게 제안했던 경험이나 가철학 위에 최신의 기술을 얹어야 비로소 맥락이 닿고, 제대로 작동하는 브랜드 테크피리언스(Tech + Experience)가 시작될 수 있다.

원충렬
브랜드메이저, 네이버,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회사를 거치며 10년 넘게 브랜드에 대한 고민만 계속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