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서영길 기자] MBC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되기 전인 지난 8일, 그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출한 자신의 소명서에 느닷없이 언론학자들을 걸고 넘어졌다.
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 등 세 곳의 학회가 김 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9월 내놓은 공동 성명서에 대한 불만 섞인 변론이었다. 그만큼 학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가 김 전 사장에겐 큰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영향력을 미친 성명서에 참여한 언론·방송학자는 총 467명이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자유를 훼손해온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성명서 후반부에 자신들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이 같은 언론학자들의 자발적·적극적 의지 표현은 결국 ‘언론 적폐’로 지목된 김장겸 사장의 해임에 일조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성명서를 통한 학자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 특히 사회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층이자 교육자들인 만큼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다.
3개 학회의 공동 성명 발표가 있기까지는 보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8월 20일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가 학회별 검토와 수정을 거쳐 9월 6일 발표됐다. 실질적으로 학회원들의 서명을 취합한 시간만 따져 본다면 보름보다 짧았을 거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A교수(편의상 모두 ‘교수’로 지칭)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학자들이라면 적어도 성명서에 총 인원 중 몇 명이 참여했다 정도의 정보는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만약, 참여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학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보다 폭넓게 중지를 모으기엔 기간이 짧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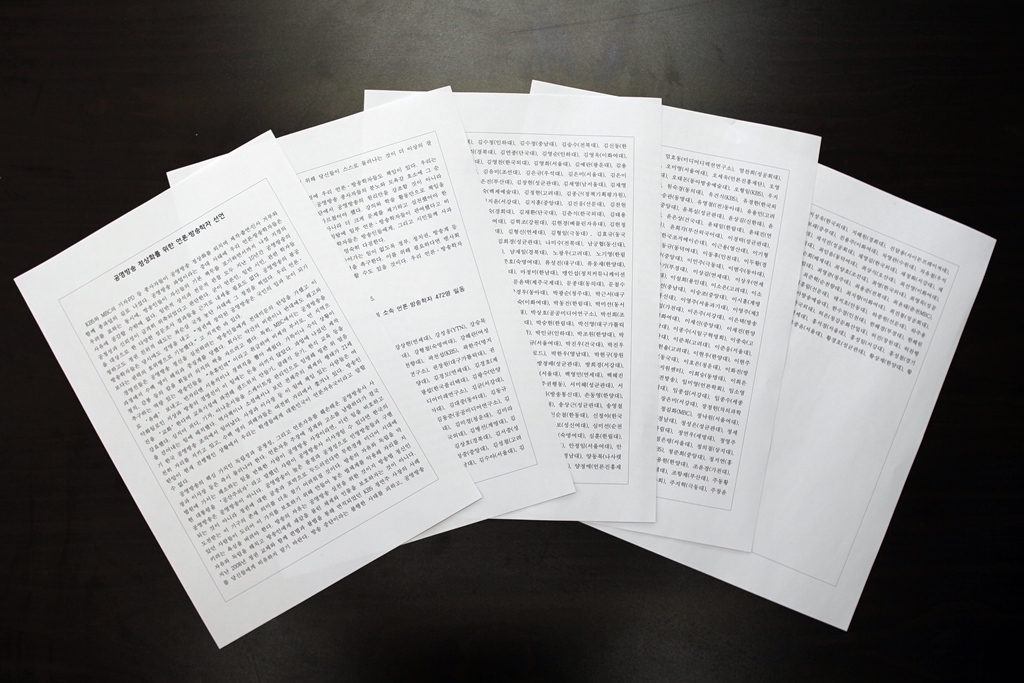
실제로 학계 일각에서는 3개 학회 총 회원의 과반도 참여하지 않은 성명서가 이들 학회를 대표해 발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존재한다.
현재 3개 학회의 회원수는 3000여명으로 <더피알>이 취재한 결과 언론학회 1400여명, 방송학회 1000여명, 언론정보학회 6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중복된 회원을 제하더라도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 참여한 언론학자는 전체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467명이었다.
이에 대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B교수는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B교수는 “학회 내에서도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것이다. 나서기 싫어서 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해서 안 했을 수 있다”며 “과반도 참여 안 한 성명서를 학회 명의로 낸 것은 분명 잘못이다. 결국 (성명서가) 모든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공적으로,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A교수도 “참여 인원이 500명이 안되는 성명서를 학회 차원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선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성명서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했다. 그는 “사실 성명서에 뜻을 같이 해도 국립대나 공공기관에 있는 학자들은 자신의 위치상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그들이 모두 성명에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학회원들의 참여률이 다소 낮았던 이유에 대해 C교수는 언론학자들 사이에 흐르는 자조적 분위기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C교수는 “교수들이 (공영방송 파업과 관련해) 지금껏 한 게 없는데, 세상이(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 ‘우리가 누굴 탓할 형편인가’하며 자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때문에 심적으론 동조해도 서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교수들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방송사 한 기자는 자신들이 파업할 땐 전혀 안 도와주다, 정권이 바뀐 이제서야 목소리를 낸다며 오히려 불쾌해 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들려줬다.
반면 서명을 하지 않은 교수 중에도 성명서의 채택 과정이나 대표성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D교수는 “선출 혹은 선임된 3곳의 학회장들은 이미 회원들의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여 성명서를 채택했다면 곧 학회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며 “성명서 참여 인원이 적어 대표성이 없다고 하는 건 기계적 적용일 뿐이다. 이건 투표율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교수는 교수들의 집단적 의견 표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교수들은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은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으로 성명 식의 의견을 내는 게 옳은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반면 E교수는 학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며 공동 성명서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E교수는 “사실 언론학회만 봐도 1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200여명 수준”이라며 “총 학회원이 2000명이든 3000명이든 표면적 수치만 보면 (성명서 참여 인원이) 적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대부분 성명서에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 결국 대표성이 없다는 건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E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언론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오히려 아무 말 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책임을 등한시 한 것이라고 본다”며 “참여를 못했든 혹은 안했든 그 분들은 다른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