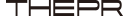언론사 수익 직간접적 영향 전망…기사 송출시 고의적·상습적 오분류 잡아야

[더피알=임경호] 몇 개월 단위로 포털뉴스 댓글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 댓글로 인한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악플 예방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지만 한편에선 공론장을 한발 퇴보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털 정책 변화가 트래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마땅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전재료 폐지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
댓글 정책 변화의 테이프는 다음이 끊었다. 그게 지난해 10월이다. 고(故) 최진리(설리)씨의 죽음이 도화선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연예 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다. 악플 문제에 칼을 뽑은 셈이다.
네이버도 뒤따랐다. 지난 3월 5일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하며 변화를 알렸다. 네이버는 19일에도 △댓글 작성자 닉네임 공개 △댓글 이력 공개 △신규회원 가입 7일 후 뉴스 댓글 허용을 골자로 잇따라 댓글 정책을 손봤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네이버는 한때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과 드루킹 사건 등으로 여론조작을 방기했다는 전방위 비판에 시달렸다. 포털 뉴스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한동안 국정감사에 불려 다녀야 했다.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 변화 배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검색어 노출 차단의 두 가지 방법
정책 변화 여파는 단시간 내 나타났다. 누리꾼들이 자신의 댓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댓글 이력을 공개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는 비율이 14.5%까지 올랐다. 올해 본인 삭제 댓글 비율 평균치가 10.9~13.3%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치다.
이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매거진 정기구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