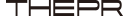메타버스 개발 추진, 콘텐츠 제작 능력 확보 분주
세분화되는 시장 흐름에 제3자 검증 서비스 등 등장

① 종대사, 디지털 매출 50% 시대
② 넥스트 디지털 향한 과제는?
전통매체 시장에서 덩치를 키워온 종합광고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난제도 커지는 모습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긴 하나, 수익성 면에서는 확연히 전통매체 광고 대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한 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광고회사는 렙사, 바이럴회사, 퍼포먼스회사 등에 대대행을 주면서 수수료를 나눠야 하고, 내재화하더라도 디지털은 운영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면이 있어 수익성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광고주가 발주하는 예산만 보더라도 TVC는 수십억 단위 집행이 이뤄지나, 디지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각 종합광고회사들이 아예 인수 등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들을 품에 안는 것도 긴밀한 대응력을 갖추려는 시도인 동시에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광고업계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필요한 인력은 동일한데, 제작비 측면에서 온라인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확 다운되기도 하고, 대대행 구조로 제작하다 보면 결국 한정된 수익을 셰어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 계속적인 인수가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현황을 전했다.
종합광고회사들이 M&A를 통해 디지털 매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모회사와는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크레딧잡 기준 이노션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9010만원으로 잡히고 있지만, 디퍼플의 경우 평균연봉이 351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종합광고회사들이 내부에 디지털 인력을 내재화하는 흐름도 있지만, 자회사로 편입이 선호되는 이유 또한 이같은 인건비 차이가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디지털 광고가 업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지만, 무한정 사람을 뽑는 건 쉽지 않고, 자체 인력을 디지털에 투입하기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매거진 정기구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