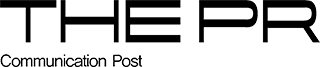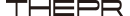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문용필 기자]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콘텐츠 생산 현장에서의 회의적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의 특성상 야근을 밥 먹듯 하는데 인력 보충 없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PR‧광고 등 커뮤니케이션 업종, 여기에 언론을 포함해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군의 종사자들이다. ▷관련기사: 주 52시간 근로, 콘텐츠 생산현장 ‘워라밸’ 보장할까
모 PR회사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우리 회사는 비교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편”이라면서도 새 법안에 대해 “남의 나라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와 닿지 않는 제도다. 홍보업계 사람에게 반영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의 B대리는 “시간 투입이 업무량 책정의 베이스가 되는 제조업과 달리 우리는 야간이나 휴일 중에 갑자기 클라이언트의 업무가 생기면 단시간에 서포트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른 업체의 업무를 하청 받는 입장이다 보니 클라이언트의 업무 스케줄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패턴에 맞춰야 한다”며 “(법이 바뀌었다고) 당장 큰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속내를 전했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C 기자는 “언론은 노동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직종"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D기자 또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면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와 관련,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뉴스는 다른 상품과 달리 최신성과 속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며 “뉴스 상품의 특성, 이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조직문화 등을 고려해볼 때 52시간 근무는 언론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를 지키자니 당장 상품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는) 블루칼라를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본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종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시간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블루칼라식의 통제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일 언제까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퇴근하라’며 과정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편법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노무법인 마로의 박정연 공인노무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방향은 좋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임금삭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장시간 근로를 통해 (추가수당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맞춰가는 가장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비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어렵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모 케이블 방송사 PD는 “(업무상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워라밸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보완을 해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