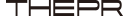메타버스 게임 인기, 입점 통해 소비자 만나는 시도 이어져

# 게임 속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친해진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닌다. 어떤 브랜드가 게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가상세계 속 지인들은 함께 구경 가자고 얘기한다. 게임으로 브랜드를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내일은 다른 친구에게 게임 속 브랜드 공간을 소개시켜줄 예정이다.
요즘 게임에서 겪는 소소한 일상이다. 게임은 이제 브랜드들이 신경 써야 하는 또 하나의 ‘매체’이자 마케팅 무대가 됐다.
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채널된 게임
② 캠페인도, 자체 제작도…올라간 게임의 위상
③ 게임 활용한 실험까지…국내는 왜 안 되나
[더피알=정수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가 게임을 즐긴다. 친숙함으로 따지면 그 어떤 막강한 매체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위상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코로나19라는 초대형 변수가 게임업체에는 호황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마케팅 매체로써 활용도도 높아졌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한 게임은 유저풀(user pool)이 크고, 자사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과거에도 게임을 이용한 브랜드 노출이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방식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게임의 영향력이 커졌고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도 넓어지면서 마케팅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 시국에 게임을 권장하는 등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소비자 접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는 브랜드들에게도 게임은 부담 없이 녹아들 수 있는 매체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이완된 분위기를 주는 친근한 매체인 게임 속에서 브랜드를 자주 접하면 브랜드 친숙도가 올라가고, 친숙도는 호감도를 상승시킨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에 직접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임 분야가 있으니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발매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소노 크래시’에서 처음 쓰인 단어다. 소설 속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통해 활동한다.
이후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현실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곳으로 칭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매거진 정기구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