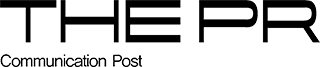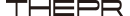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브랜드의 시간과 공간’ 칼럼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는 두 개의 시선을 통해 브랜딩과 마케팅 그 이면의 의미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해도 핫한 슈프림(Supreme)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더피알=원충렬]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그 흐름의 실체를 손으로 잡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늘 탐구나 성찰의 대상이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마찬가지다. 브랜드에 있어서도 시간이란 흥미로운 주제다. 어떤 브랜딩을 단지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만으로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 주제는 ‘한정’, 달리 말해 시간의 제약이다.
이성을 합리로 마비
대학생 시절, 국제정치 교양수업에서 국가 간 전쟁 발발 조건들에 대해 배웠다. 대체로 국가 행정부나 원수가 사안에 이성적으로 대응할 경우 쉽사리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압박(time pressure)이다.
전쟁마저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의 압박. 마케팅에서는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마트에서 종료임박 세일을 알리는 소리에, 홈쇼핑에서 이 조건은 오늘이 마지막이란 문구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던가. 결국 시간의 한정이란 사고과정의 한정이기도 하다. A라는 조건에 B라는 함수를 거쳐 C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A에서 바로 C로 점프시킨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에 우리가 늘 당하는 건 아니다. 반복되는 한정 조건에도 학습은 있다. 종료임박 세일에 제육볶음을 묶음구매 했더니 일주일 내내 제육볶음만 먹다 남기게 되거나, 같은 조건은 없다던 홈쇼핑 제품이 구성만 살짝 바뀌어서 더 싼 가격으로 나오는 걸 목도하는 순간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불만족이 쌓이면 아예 그러한 시간 제약 메시지에 대한 행동을 불매 결정으로 자가 프로그래밍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시간압박이란 제약이 늘 만족스러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증이 있다면? 그렇다면 시간압박이란 뇌를 거치지 않고도 답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일 뿐이다. 슈프림(Supreme)이 바로 그렇다.
슈프림은 1994년 설립된 뉴욕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다. 슈프림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드롭(Drop)’ 시스템이다. 드롭은 매주 목요일 신제품이나 한정판을 극소량만 판매하는 슈프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다. 무엇을 드롭하든 일단 사면된다. 고민할 필요 없다. 그걸 소유하든, 혹은 되팔든, 후회란 있을 수 없다. 살 수만 있다면 말이다.

V = P / T
드롭 시스템은 분명 엄청난 시간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슈프림을 매장에서 살 수가 없다. 매장에는 수요일 오후부터 이미 긴 줄이 만들어진다. 온라인은 오히려 더하다.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가치(V)는 사려는 사람(P)에 비례하겠지만, 동시에 살 수 있는 시간(T)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함수는 결국 슈프림의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로귀결된다.
물론 슈프림이 만들어낸 희소성이란 가치가 애초에 아무런 코어(core)없이 시작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명 슈프림은 유스컬처(youth culture)를 대변하며 마이너 문화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왔고, 그와 동시에 제품 자체도 품질 경쟁력이 있었다.
실제로 슈프림을 설립한 제임스 제비아(James Jebbia)는 성공 비결에 대해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도덕책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그 코어만은 단단했을 것이라도, 그것이 2000년대 이후 이토록 기하급수적 가치 팽창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슈프림만의 독특한 희소성 관리 때문이란 걸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건 분명 엄청난 매력의 덫이 된다. 하지만 그러한 매력에 빠져있는 것이 나만이 아니란 사실이 결합되면, 매우 안심하며 아낌없는 소비와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사려는 사람은 점점 늘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완벽히 제어되면서 가치는 폭등 중이다. 이를 보며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슈프림은 본래 다수를 위한 패션을 지향하지 않음에도 그 소수성이 오히려 다수를 매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슈프림이 지닌 제약이 단지 마케팅 수단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본질에 녹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뒷골목의 샤넬이 만든 시간
단지 벽돌에 로고를 새겨 팔아도 완판되는 슈프림. 이 한정판에 대한 욕구는 드디어 신문마저도 완판시켰다. 지난 8월 13일 하루 23만부가 발행되는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지는 약 2시간 만에 거리에서 사라졌다. 특별한 경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1면에 슈프림의 로고가 인쇄돼 있었을 뿐이다.
사실 뉴욕을 거점으로 한다는 것 외에 뉴욕포스트와 슈프림은 딱히 공통점이랄 게 없다. 이른바 고객(구독)층도,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란 게 진정한 콜라보의 묘미일 것이고, 과연 반응도 뜨거웠다. 그간 화제가 된 수많은 콜라보가 있었지만, 이번 신문과의 콜라보는 시간의 관점에서 봐도 흥미롭다.
신문은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종이다. 하지만 ‘그날의 종이’이다. 하루가 지나면 사실상 가치를 상실해버린다. 내일의 신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적 가치는 여전하다. 창문을 닦는다거나…) 그런데 슈프림이란 로고는 이 하루의 유예를 소비 시간의 제약으로 연결시키며 또다시 소유의 가치를 부여했다.
당연한 듯 사람들은 달려 나가 1달러에 뉴욕포스트를 사서 이베이에 20달러로 올린다. 그걸 또 다른 사람은 산다. 제품 당 400개 만 만드는 다른 한정판 슈프림에 비해 몇 만장의 신문은 그 희소성이 현저히 낮을 텐데도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다. 슈프림이니까. 내일은 없으니까.
뒷골목의 샤넬이라 불리는 슈프림. 이러한 수사는 결국 그들의 공통적인 희소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샤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슈프림의 희소성이 생성되는 화학식에, ‘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