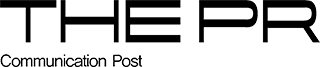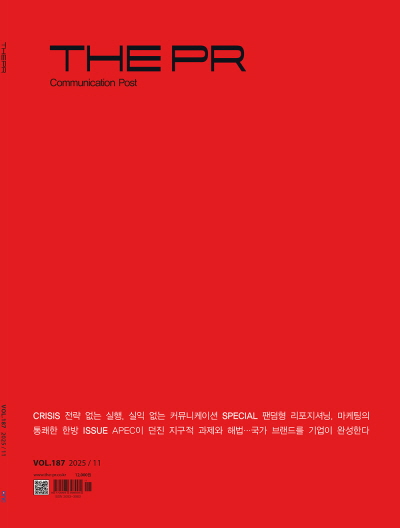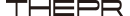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허원순|르네상스 이후 서양의 문화예술을 알려면 큰 축을 이해해야 한다.
음악과 미술을 비롯해 문학 등 근대 문예 사조를 태동하고 형성한 기본 축은 이성과 감성이다.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는 예술 사조가 있고, 감성이 중심인 문예 사조가 있었다. 이성의 옆에 합리 논리 분석 같은 가치가 있다면, 감성의 축 옆에는 감정 격정 직관 같은 가치가 있다.
르네상스 직후 고전주의 예술은 인간 이성이 중시된 사조였던 반면 바로 뒤이어진 낭만주의 시대에는 감성과 감정이 더 고양됐다. 그다음에 등장한 사실주의가 이성 중심이라면 그 이후 자연주의는 감성 기반이다. 이어 신고전주의가 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면, 초현실주의는 감성에 호소하는 사조다.
주의해서 볼 점은 순환과 반복이다.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은 뒤로 밀리고 달이 차듯 때가 되면 그 반대로 된다. 이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시일이 지나면 그에 대한 반발로 감성과 감정이 중시된다. 그러다 다시 이성이 복귀하면서 감성이 뒤로 밀리지만 어느 순간 다시 인간 이성은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래로 가라앉고 감성이 존중받는다. 그렇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가 반복된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를 추구하되, 사실 그렇게 완전하지도 않다.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지도 못하다. 그래서 감정과 감성, 격정과 직관에 매달려도 보지만 이것 또한 충분하지도, 계속해서 만족스럽지도 못한 가치다. 어느 쪽이든 의미 있는 창작물을 생산해내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성이든 감성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덕분에 역사로 보면 서양 문예사는 폭넓고 다양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문화 예술품을 남겼다. 어느 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할 수 없는 인류의 자산이다. 이성의 산물이든 감성의 소산물이든 다 귀하다.
경제에도 축이 있다. 경제 질서나 경제 체제, 이념에는 무엇보다 자유와 형평의 가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형평 혹은 평등은 오래된 가치다. 서로 배척하지만 서로 보완관계이기도 하다 자유와 형평은 정치의 영향력과 결합할 때 다른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본이나 자산시장에서는 어떨까. 탐욕과 공포가 그런 축이다. 탐욕과 공포의 축으로 보면 경기의 순환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호황과 활황부터 수축과 냉각, 침체에 이르기까지, 또 바닥에서 천정까지 변하는 경기사이클의 변동 축으로 탐욕과 공포가 있다. 그렇게 인간 심리, 집단 심리로 봐도 된다.
이성과 감성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탐욕과 공포도 반복한다. 탐욕이 의욕 정도 수준으로 살아나면 활황이 되고, 활황을 넘어 호황으로 탐욕이 부풀어 오르면 거품이 형성될 것이다. 모든 거품의 뒤에는 탐욕이 있다.
그러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공포기가 온다. 공포가 심해지면 안정과 침체를 넘어 저평가 냉각기 폭락기가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탐욕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움트듯, 처음에는 여린 의욕이다. 그 의욕은 점차 탐욕으로 커진다.
글로벌 증시와 일부 자산시장,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어디쯤 놓여 있을까.
각국이 경쟁적으로 낮춰온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 AI를 넘어 AGI로 성큼 뛰어드는 신문명 내지는 새 산업에 대한 넘치는 기대, 좀비기업과 한계 산업까지 껴안고 가는 포퓰리즘 정책들, 양극화를 무색하게 하는 신 세계적 미래 전망, 신냉전 시대라면서도 무력 충돌을 겁내지 않는 곳곳의 낙관주의 이런 기류가 이리저리 끝없이 얽혀 있다. 경제와 비경제 구별도 없다. 모든 게 경제와 자본 문제로 귀결되는 것도 같다.
국제 기류를 보면 특정 국가만의 현상도 아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더 한 것도 특별히 덜 한 것 같지도 않다.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4000에 오르더니 며칠 새 곧바로 4200을 넘었다. 다시 급락하면서 롤러코스트 조짐도 보인다. 여기에 탐욕은 없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 겁이 나 못 사겠다는 개인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공포가 퍼진다. 이 공포는 물론 불황 수축기의 공포와는 결이 다른 차원이다. 탐욕 심리에 대한 본능적 견제나 반작용에 가까운 공포다.
한편 고점에 놀라며 한편으로는 연일 신고가를 즐긴다. 코스피 지수 5000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6000까지 언급한다 싶더니 급락이다. 욕심과 의욕 이상의 심리가 생길 만한 여건이다. 동시에 고점이 무섭고 신고가가 겁이 나 사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거품이라는 말이 아직은 많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은 탐욕의 시기가 아닐지 모른다. 좀 더 지나가 봐야 한다. 거품의 여부는 그 시기에서는 알 수 없다. 그걸 판단한다면 현자, 진정한 투자의 고수다.
흥미로운 것은 FOMO(fear of missing out) FOPO(fear of peak out) 현상이 교차한다는 평가다. 전자는 연일 오르는 주도 주식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고, 후자는 주도 주를 지금 샀다가 나만 꼭지에 물리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다.
달리는 저 말에 지금이라도 올라탈 것인가. 이 현란한 질주에서 이제 나는 뛰어 내려버릴까. 상황은 며칠 사이에 급변한다. 탐욕과 공포, 도전과 냉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많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
이 탐욕과 공포 사이에 불안이 있다. 불장이라는 주식시장을 안 보면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 모두 서학 개미 한다며 가버려서 식어버린 국장을 연민의 눈으로 보며 나와 상관없는 무대라고 여기면 나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탐욕도 불안도 생길 일 없다.
하지만 한국 돈 원화 빼고 금융과 실물의 모든 자산이 오른다는 시대 ’에버리씽 랠리‘ 시대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FOMO로 이어진다. 불안과 초조가 악수를 두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단기 고점에서 롤러코스트 장세는 단기간 안에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거나 뒤섞여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대중심리의 시대가 된 것 같다.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해야 할 판이다.
행복의 첩경은 무엇일까. 돈과 수익일까,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일까. 자산 양극화와 유동성 범람의 버블 우려 시대에, 만연하는 FOMO 시대에 인류에게, 아니 스스로에 던져 보는 본원적 질문이다. 우리는 버텨내고 살아남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