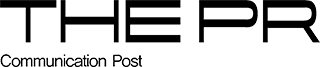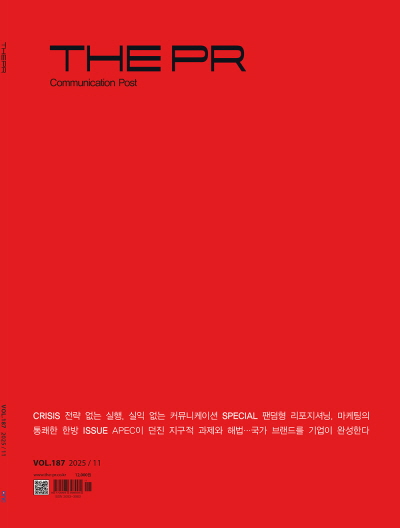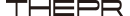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정용민 | 위기관리 교과서 중 개론서라면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이 ‘위기의 정의와 유형’이다. 위기가 발생하는 형태를 저자마다의 시각으로 분류해서 정의하고 구별해놓고 있다. 그 교과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며 위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위기관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교과서 내용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위기유형은 사실 현장에서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 같은 유형의 부정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업은 그것을 위기라 하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은 그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을까? 왜 기업마다 위기의 정의는 다를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사업 분야에 따라 위기가 다르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라면을 만드는 기업과 선박을 만드는 기업은 전혀 다른 유형의 위기를 경험한다. 매출 10조원 기업의 위기와 매출 100억원 기업의 위기는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규제기관에 의해 사업 인허가가 좌우되는 기업과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다른 위기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지역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각자 생각하는 위기가 다르다.
둘째, 내부 철학과 원칙에 따라 위기가 다르다
같은 부정 상황을 놓고도 어떤 기업은 그것을 부정성이 낮은 수준이라 평가하고, 적극적 위기관리를 하지 않는다. 오래된 업계 관행이라 하거나, 기업의 오래된 전통이라며 그 상황을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어떤 기업은 앞의 기업이 놀랄 정도로 깐깐하게 부정성을 판단해 같은 상황을 위기로 다양하게 정의한다. 이 기업은 업계관행은 물론, 당연해 보이는 업무 프로세스도 컴플라이언스라는 잣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된 발생 상황들을 모두 위기라 정의하고 대응한다.
셋째, 사업 전략과 방향성에 따라 위기가 다르다
어떤 기업은 무리해서 더 크게 성장하거나 시장을 넓히겠다는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웬만한 여론의 비판이나 소송, 환경 및 지역단체들의 항의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식으로 위기를 바라본다.
다른 어떤 기업은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해 국내와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진입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자회사들을 지속 상장하려고도 노력한다. 이 기업은 앞의 기업보다 고객과 시장 그리고 정부 규제기관 등의 눈치를 많이 본다. 자칫 조그마한 논란이나 비판이 사업 확장과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한다. 이런 기업은 다양한 위기 유형을 정리해 대비하는 위기관리 활동에도 열심을 다한다.

넷째, 기업을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위기는 다르다
일단 B2B(기업 대상 사업) 기업과 B2C(개인 소비자 대상 사업) 기업은 각자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B2B는 굵직하고, 규제 관련, 경쟁 관련 부정 상황들이 많다면, B2C는 고객과 관련된 다양하고 자잘한 부정 상황들이 흔하다.
고객의 경우에도 국내 고객이 중심인 기업의 위기가 다르고, 해외 고객이 중심인 기업의 위기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별 위기라 볼 수 없는 상황이 해외 특정 국가 고객들에게는 큰 위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의사결정자들의 스타일에 따라 위기는 다르다
젊고 진취적인 스타트업 대표의 위기관리 시각과,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보수적인 대기업 대표의 위기관리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 각자 특징에 따라 위기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위기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모습도 전혀 다르다.
단순하게 감정적 부침이 잦은 스타일의 경영자가 보는 위기와 안정적인 감정상태에서 담담하게 의사결정 하는 스타일의 경영자의 위기가 다르다.
(사실, 현장에서는 VIP가 그 상황을 위기라 정의하셔야 비로소 위기가 된다. VIP가 위기라 정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닌 것이 된다.)
여섯째, 기존 위기관리 시스템 수준에 따라 위기는 다르다
평소 위기관리를 생각해 보지 않고, 관심이나 투자가 전혀 없던 기업에게는 돌발적 혼돈 상황이 발생되면 이는 곧장 패닉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가 되어버린다. 흔한 예로, 언론은 그냥 광고를 싣는 곳이라 생각해 담당 기자관리를 등한시했던 기업은, 자사와 관련된 사소한 부정기사에도 큰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 상황을 위기라 정의하기도 한다.
반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상당수준 갖추고 숙제를 꾸준히 잘 해 왔던 기업은 다른 위기관을 가진다. 앞의 기업이 고통스러워 한 부정 기사 정도는 위기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양한 대응을 실행해 상황을 관리해 버리기 때문이다.
10월 31일 진짜 시스템 세우려면…‘정형화된 위기, 기대도 말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