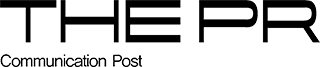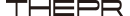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신아연 객원기자 | 타자(他者)에 대해 생각한다. 나에 대해 생각한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다. 나아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타자 속에는 이미 내가 반영되어 있고, 나와 그리고 모든 타자들이 곧 ‘사람’이기에.
나만 따로 똑 떼어 생각해 본다거나, 나는 쏙 빼고 타자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 이해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타자 속에서 존재한다.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내가 놓인다. ‘끼리끼리 다닌다’는 말이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그 뜻이다. 타자 중에서는 상호작용이 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타자가 있기에 그 타자들 위주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곧 나를 증명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던 그 ‘관계 속의 인간’이 지금 위태롭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 긴밀히 속해 살아가는 이른바 공동체 개념이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복된 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에 서로 머리를 맞댄다는 의미의 ‘사회적 동물’이었던 것이다. ‘믿거라’하는 공동체를 바탕에 깔고 있는 고대사회의 언어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어 있다. 어쨌거나 인간은 혼자 살면 죽는다. 제 아무리 독야청청, 독불장군이라 한들 SNS를 통해서라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하물며 ‘눈팅’조차도 관계다. 진짜 아무 관계도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 인간세상에서 논할 존재가 못 된다.

그렇다면 왜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지 않고 타자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타자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새삼스러움 때문이다. 흔히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하듯이. 모르면서도 서툴고 위험한, 심지어 사기 및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관계 맺기가 사각지대처럼, 지뢰처럼 깔려있는 세상이다.
공동체 울타리가 붕괴되고 매우 헐거운 작금의 사회적 동물의 현실에서는 나를 골똘히 ‘파는’ 것보다 타자를 아는 것이 효율적인 인간 이해이자, 보다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
가령 사이버 상의 대표적 사기이자 전형적인 관계 맺기의 사각지대인 ‘로맨스 스캠’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 당면한 타자, 즉 ‘상대’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
정체부터 파악해야 한다. 나를 아는 것과 타자를 아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지만 관계에 따라선 어느 한 면에 치중할 때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