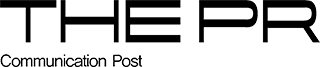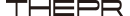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박주범 기자 |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른바 헤리티지(heritage) 브랜드의 주요 과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지만 보전과 혁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최근 뉴스위크는 코카콜라가 Z세대를 겨냥한다며 출시했던 스파이스드(Coca-Cola Spiced) 제품이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단종될 수밖에 없었던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고, 더드럼에는 헤리티지 브랜드들의 Z세대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기고가 실렸다.

스파이스드는 ‘상쾌한 라즈베리 맛과 엄선된 매운맛을 결합한 고전적 코카콜라 맛’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2024년 2월 출시됐다. 코카콜라가 미국 시장에서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었으나, 1년도 안 돼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코카콜라의 다양한 스핀오프(각각 2002년과 1985년에 출시된 바닐라와 체리맛은 현재도 생산중) 가운데 이번 스파이스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Z세대와의 소통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하와이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의 라이언 웨이트 마케팅 교수는 “Z세대는 탄산음료에서도 건강을 추구한다”며 스파이스드는 진정성과 혁신에 대한 Z세대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브랜드 추적 스타트업 트랙수트(Tracksuit)의 올해 4~9월 18~34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코카콜라를 ‘유해한’, ‘설탕이 들어간’, ‘다이어트’ 등의 단어와 연관시킨 반면 경쟁사 포피(Poppi)는 ‘건강’, ‘유기농’,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했다.
트랙수트의 공동창립자인 매트 허버트 CEO는 “올리팝(Olipop)과 포피는 건강을 중시하는 Z세대를 타겟으로 하여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는 시기에 건강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스드’라는 명칭 자체가 음료의 맛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진저비어나 칵테일 블러디 메리(Bloody Mary)가 떠오르는 매콤한(spicy)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맛과는 거리가 먼 음료에 잘못 붙였다는 것이다.
레브레인 광고사의 엘리자베스 위어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이전의 스핀오프 음료들이 맛을 잘 반영했던 것과 달리 ‘스파이스드’라는 이름이 매운 맛과는 거리가 있는 라즈베리 음료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위어 CMO는 “소비자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레딧에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이 제품의 맛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잘못된 명칭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마케팅 방식이 타겟과 맞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 버터밀크의 설립자인 제이미 레이 CEO는 “올리팝과 포피는 요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라며 “건강을 고려한 재료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 브랜드가 이들과 경쟁하려고 했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 호소력이 큰 모델을 기용하고, 소셜미디어 위주의 접근을 전개하는 등 Z세대의 가치관에 빠르고 혁신적으로 대응해야 했다고 레이 CEO는 강조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디스히어(This Here)의 리비 무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매체 드럼(The Drum) 기고에서 “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정체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어는 “브랜드의 힘은 과거에 있다”며, 헤리티지 브랜드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감정적 연결고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첫 번째 사례로 든 것은 9월 30일 발표된 팀버랜드(Timberland)의 아이코닉 캠페인. 노란색 부츠가 자기 브랜드의 가장 아이코닉한 상징이라는 점에 집중한 팀버랜드가 유명 모델들을 내세워 문자 그대로 노란 부츠를 제외한 모든 의류를 벗긴 광고 캠페인이다.
무어는 “많은 헤리티지 브랜드가 청중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다양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대중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용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유형과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확장될 수 있는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충고다.
같은 맥락으로, 1922년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작업복 브랜드 디키즈(Dickies)는 100주년 기념 TV 다큐멘터리 ‘메이드 투 래스트(Made To Last)’에서 농장과 스케이트 보딩, 자동차정비소 등 다양한 배경의 캐릭터들을 하나의 일관된 아트 디렉션과 감정적 내러티브로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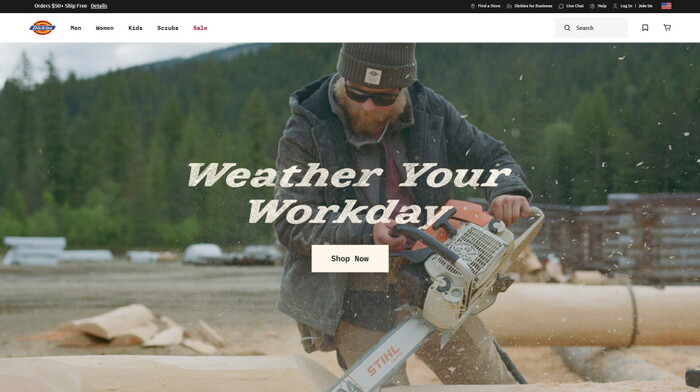
무어는 “헤리티지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인간심리에 따라 소비자들을 쫓아다니는 대신 각자가 이를 재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리티지 브랜드의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하위문화가 브랜드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것이고, 이런 발견의 느낌은 궁극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확립된 무언가에 대한 소유감을 주면서 브랜드를 그들만의 것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무어는 스킨헤드족이 닥터마틴(Dr. Martens)을 신고, 스케이터들이 칼하트(Carhartt)를 입은 것, 랩 장면에서 노스페이스가 등장한 사례의 공통점은 브랜드가 이것을 나서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명확한 하나의 브랜드 메시지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당시의 젊은 세대에게 맡겼다.

캘빈클라인 역시 섹시함을 스스로 재정의하며, 10년 전의 #MyCalvins 캠페인부터 현재의 제레미 알렌 화이트(Jeremy Allen White) 캠페인까지 Z세대가 스스로 브랜드에 접근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결국, 헤리티지 브랜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레거시(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Z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어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