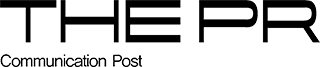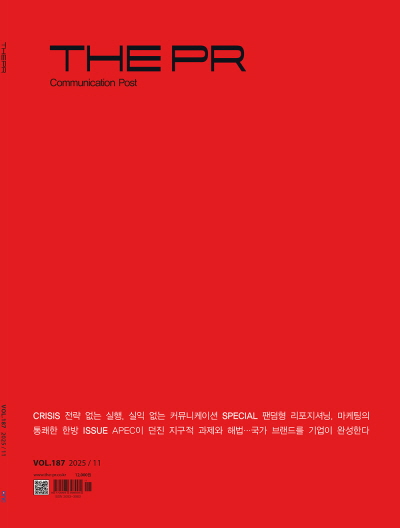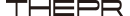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김경탁 기자|모든 콘텐츠 소비의 출발점은 이제 스마트폰이다. 그러나 자유로움을 가져다주는 작은 화면은 장시간 몰입을 하기어렵다는 한계를 뚜렷하게 갖고 있다. TV는 큰 화면과 선명한 화질로 만족감을 주지만, 여전히 거실 한켠에 고정돼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태블릿은 이 두 세계의 중간 지점에 서 있지만, 화면 크기와 휴대성 모두 어정쩡해 ‘제2의 스크린’으로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다양한 거치대 제품들이 소비자를 고민시켜왔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우며 이동형 스크린이 나타났다.
첫 문을 연 것은 LG의 ‘스탠바이미’였지만 소비자들의 자발적 DIY인 ‘삼탠바이미’가 시장을 키웠다. 삼성은 ‘무빙스타일’로 이를 제도화했고, LG가 다시 ‘스탠바이미2’와 ‘스마트모니터 스윙’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그렇게 이동형 스크린은 가전업계 맞수의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했다.

스탠바이미, ‘무선 이동형 스크린’ 시대를 열다
2021년 여름 등장한 LG 스탠바이미는 그 자체로 가전 시장의 실험이었다.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해 전원선 없이 최대 3시간 사용할 수 있고, 바퀴 달린 스탠드 덕분에 침실, 주방, 거실, 심지어 베란다까지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스크린’이라는 마케팅 슬로건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혁신은 늘 양면성을 갖는다. 출고가는 100만 원을 넘었고, 화면은 27형 FHD 해상도에 머물렀다. “아이패드보다 크지만 TV로 사용하기는 애매하다”는 평가가 뒤따랐으며, 가성비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시장을 연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불만들에 대해 “스탠바이미는 무선 배터리와 터치 화면이라는 독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가격이 단순히 비싸다기보다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키운 시장, ‘삼탠바이미’ 열풍
스탠바이미의 인기는 곧 DIY 바람으로 이어졌다.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스마트모니터(M7, M8)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동식 스탠드를 결합한 ‘삼탠바이미’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다.
LG 제품의 절반 수준 비용으로 더 큰 32~43인치 화면에 4K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터치스크린이 아니라는 단점 정도는 빠른 리모콘 반응속도로 커버된다는 평도 나왔다.
‘삼성 모니터’와 ‘스텐바이미’의 합성어인 ‘삼탠바이미’라는 별명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다. 실제로 유튜브 리뷰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스탠바이미보다 싸고, 더 크고, 화질도 좋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됐다.
이동식 스탠드 제조사들이 ‘삼탠바이미 전용’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커뮤니티에는 거치대 추천 리스트가 공유됐다. 소비자가 만든 이 생태계는 스탠바이미의 단점을 보완하며 이동형 스크린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켰다.

삼성, 무빙스타일로 제도화에 나서다
소비자의 DIY 흐름을 삼성은 놓치지 않았다. 2023년 11월, 삼성은 ‘무빙스타일’을 공식 출시하며 이동형 스크린 시장에 정식으로 뛰어들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유의 제품을 잘 안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삼성 건 왜 없냐’고 하면서 스탠드를 따로 사서 조합해 쓰기 시작했다”며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무빙스타일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과는 눈부셨다. 출시 8개월 만인 2024년 7월, 무빙스타일은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량 5만 대를 돌파했다. 같은 해 4분기에는 삼성 스마트모니터 판매량의 80% 가량이 무빙스타일일 정도로 소비자 선택이 집중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무빙스타일은 모니터로도, TV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소비자 취향에 맞게 스탠드 형태를 고를 수 있고,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얹어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선택이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빙스타일의 성공 비결은 ‘선택권’이었다.
올해 4월 TV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총 200여 가지 변형이 가능하게 됐다. 27형부터 44형까지 크기를 고를 수 있고, 스탠드도 선반형·암형 등 조합이 가능하며 가격도 조합에 따라 50만 원대에서 200만 원 후반대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LG의 재반격, Go·2·스윙 삼각편대
LG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 ‘스탠바이미 Go’를 내놓으며 캠핑·차박 같은 아웃도어 수요에 맞췄다. 캐리어처럼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은 젊은 층의 눈길을 끌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스탠바이미’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올해 2월에는 정통성을 잇는 ‘스탠바이미2’가 등장했다. 해상도를 QHD로 높이고 화면 크기를 키워 기존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스탠바이미 Go의 이동성을 더 강화했다. 원조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며 ‘스탠바이미의 궁극 진화형’을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두 달 뒤인 4월, LG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띄웠다. ‘스마트모니터 스윙’을 출시한 것이다. 32형 4K 터치스크린에 모니터암과 스탠드를 일체화한 구조로, 삼탠바이미 생태계의 장점을 정식 제품으로 끌어올린 프리미엄 솔루션이었다.
스마트모니터 스윙은 webOS 탑재로 PC 없이도 문서 작업·화상회의·클라우드 게임이 가능해, 단순히 감성 가전을 넘어 업무와 협업까지 포괄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 무빙스타일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유사 제품이 쏟아지고 삼탠바이미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스탠바이미만의 무선성과 터치 UX는 따라올 수 없다”며 “스마트모니터 스윙은 이런 생태계 흐름을 프리미엄화한 제품으로, 업무·학습·OTT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전업계 맞수, 새로운 전장을 열다
TV·모니터·태블릿·스마트폰의 경계가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 이동형 스크린은 단순한 보조 기기가 아니라 생활 공간을 새롭게 조직하는 매개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삼성과 LG는 ‘화질’과 ‘가격’을 넘어, 사용자가 집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또 어떤 순간에 스크린을 필요로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결국 이동형 스크린 시장의 승자는 더 많은 판매량을 올린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편하고, 그 변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안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