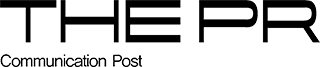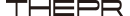더피알= 오승호 편집인|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은행들은 이자수익을 많이 내는데 대출 금리는 낮추지 않느냐”고 물으면 되돌아 오는 말이 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지적하지만 사실은 수익을 더 내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IT 등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한다.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데만 수천억원이 들어가기에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은행들은 적정한 수익을 확보해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사회공헌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주요국의 절반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들며 이자장사 비판에 대한 견제구도 날린다.

주요국의 은행 수익성 지표를 보면 2013~2022년 평균 우리나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2%로 미국(10.2%)이나 캐나다(16.8%), 싱가포르(10.8%)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 국내 은행의 ROE는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보다 높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ROE 10%라 하면 자본총액 1억원인 회사가 1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의미로, 국내 금융회사나 제조업체들은 1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내걸기도 한다.
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한가.
KB국민은행 본부장 출신인 L씨는 "우리나라의 은행 시장은 몇 개의 대형 은행이 지배하는 구조여서 경쟁이 제한적"이라면서 "시장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금리를 먼저 올리고, 떨어질 때는 예금금리를 먼저 인하해 예대금리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변동기에 예금 금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에 투입됐다. 이는 1998년 정부예산의 2배를 웃도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2년 뒤면 외환위기 발생 30년이 되는데, 공적자금 투입이 은행들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다시 한 번 분석해 봤으면 하는 심정이다.
은행들은 비(非)이자 수익을 늘리는 혁신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초고령사회와 저성장 시대에는 자금 수요가 줄어들기에 과대한 대출 의존도를 타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을 막을 수 없다.
2024년의 경우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8.6%나 된다. 비이자수익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비이자수익이 40~50%인 외국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2598억원으로 2000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가계 대출은 1806조 9975억원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등 이자 장사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기준 92.1%로,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80% 수준이 넘으면 경제 성장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월 중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실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외환 위기 때는 은행들의 기업 대출 공세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기업 부채가 화근이었지만 지금은 가계 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정책 대출도 가계 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 바란다. 지난해 9월 기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은 전년보다 51%나 증가했다.
은행들은 고질병처럼 돼 버린 예대금리 차이에 의한 이자 수익에 치우친 사업 전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해외 시장 개척이나 신사업 발굴,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나 경영 자문, 컨설팅 등의 영업 모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각종 수수료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없는 지, 세밀히 살펴 보기 바란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다시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표 예금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00%에서 2.95%로 낮췄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대표 수신 상품 쏠편한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3.00%에서 2.95%로 0.05%포인트 낮췄다.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했다.
은행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5일 금통위가 열리기도 이전 기대감으로 수신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어 민첩성에 혀를 차게 만든다.
은행들은 지난해에도 금통위가 10월, 11월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자 예금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데는 굼뜨기만 하다.
금통위가 지난해 10~11월 2차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9월 4.29%에서 12월 4.75%로 오히려 0.46%포인트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와 역주행을 한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 0.43%포인트에서 10월 1.04%포인트로 불과 3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4만 204명) 늘었다. 특히 60세 이상은 증가율이 52.4%나 됐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 영향 때문이다.
예금 금리를 대출 금리보다 더 많이 낮추는, 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 방식에 변함이 없어 씁쓸하다.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 P씨는 "예금과 대출금리는 시장에 선행해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관련해 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지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은행 수익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대출 금리 인하 분위기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자 은행 20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계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충실히 이행하느라고 대출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들이 담합이라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점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